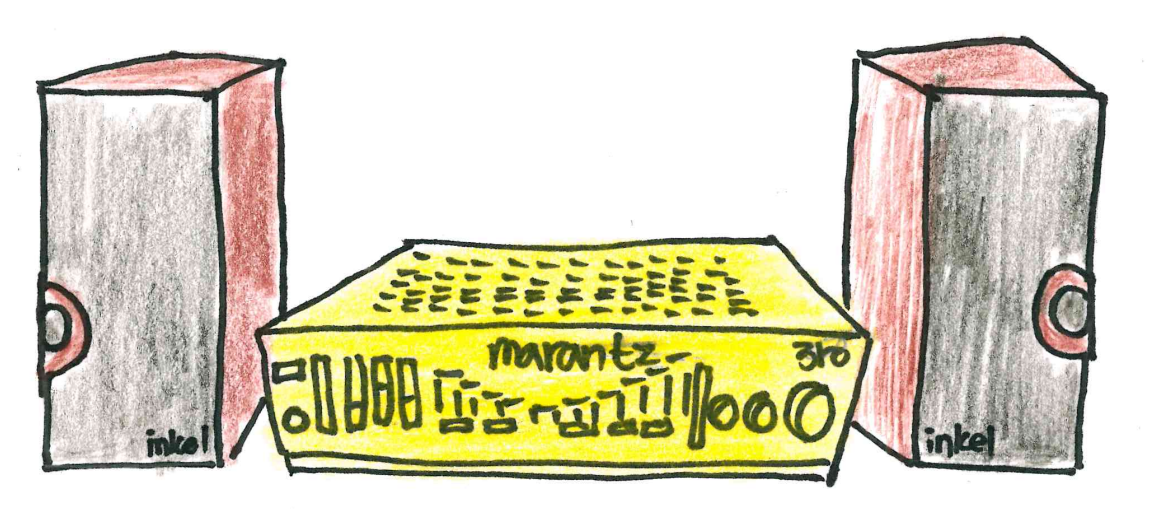
“심 안드요? 난 귀떼기 떨어지겄소. 징하게 춥네.”
칼바람 부는 겨울 아침에 부실하디 부실한 교장이 교문통에 서 있으니 짠하기도 했으리라. 지금은 퇴임한 심여사님은 우리 학교에서 10년 동안 청소일을 하셨다. 퇴임을 앞두고 가장 아쉬운 것은 “남 차려주는 급식 밥 못 먹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쌀쌀맞은 말투에 겁(?)이 났으나 이내 마음자리가 따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멋진 분이란 걸 알고 나서는 이무럽게 지냈다. 회식 자리에서 멋지게 뽑던 노랫가락과 송별회에서 펑펑 울던 기억이 또렷하다.
“학교 울타리에 존재하는 모든 어른들은 다 선생님이다.” 모든 교직원들이 같은 명함을 공유하면 좋을 듯하여 교장 부임 첫해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이벤트 명함을 제작하여 한 세트씩 선물로 돌렸는데 우리 심여사님은 도무지 가져가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뭔 명함이냐며 하면서도 다들 웃으며 가져가는데 삼일간이나 심여사님 명함은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침 교장실에 들어오셨기에 “왜 안 가져가세요?”, “명함을 어디에 쓴 다요? 남사스럽게.”, “그요? 그럼 놔두쇼. 불쏘시게나 하게.”, “그럼 아까운 게 가져갈라요? 뭔 쓸데없는 짓을 해서..” 참, 선물하고도 한 소리 들었다.
한 달쯤 지나 여사님께 살짝 여쭤봤다. “그 명함 안 쓰면 갖다주쇼. 미술 시간 모자이크 할랑게.”, “몇 장 썼는디요? 이장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손주도.” 누구 손 빌리지 않고 이 나이에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선언이었으리라. 충분히 깨우치지 못한 한글을 배우고 해준 곳도 이곳이고,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명함 뒷면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보람을 찾게 해준 곳도 여기였으니.
굵은 팔뚝으로 곳곳을 닦았던 심여사님이나, 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따뜻한 점심 준비에 온힘을 다하는 급식실 식구들이나, 교실에서 승부하는, 그곳을 지원하는 행정실과 교무실이나 누구도 대충 살진 않는다. 자꾸만 남의 책상 크기와 서류철 두께만 살피며 내 것과 저울질하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내 일의 정당성과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이놈의 찌질함은 쉬이 없어지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일터는 소중하며,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루를 허비하진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이만큼 안전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렁차다. 그러니, 교장인 나만 잘하면 된다.
심여사님은 요즘 학교에 잘 안 오신다. 마을회관에서 할매들하고 민화투 치고 함께 나눠 드시는 음식만은 못할테지만 그렇게 그리워하던 급식을 한 번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말이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앉아서 미래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0) | 2023.08.25 |
|---|---|
|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1) | 2023.08.25 |
| 학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곳 (0) | 2023.08.25 |
| 짱구쌤은 교장샘을 몇 번 해봤어요? (0) | 2023.08.25 |
| 구례일보 인터뷰 (0) | 2023.05.10 |